[ 배달겨레소리 한실 글님 ] 푸른배달말집을 펴내며 오늘날 우리가 쓰는 말은 일본말에서 들어온 말을 으뜸으로 많이 쓰고 우리 겨레말은 어쩌다가 쓰는 말살이를 합니다. 이렇게 된 까닭은 종살이(식민지생활)는 벗어났지만, 종살이배움(식민지교육)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배곳(학교)에서 배우는 말이 거의 모두 일본말에서 건너온 한자말입니다. 요즘은 한자를 안 쓰고 한글로 쓰니, 이를 한글왜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한글왜말은 배곳에서 책으로 배운 글말을 입말로 쓰면서 우리말이 더럽혀졌습니다. 배곳에서 가르치고 새뜸(신문)에서 쓰고 널냄(방송)에서 말하며, 나라살림살이말(행정용어)과 모든 책에 한글왜말을 쓰니, 백성들이 다 우리말인 줄 압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말이 아닙니다. 한글왜말을 종살이할 때는 조선왜말이라 불렀습니다. 왜종살이가 끝났으면 왜말을 버리고 우리말을 찾아쓰고, 배곳에서도 우리말을 가르치고 배워야 마땅한데도, 종살이에서 벗어난지 여든해가 가까웠는데도 아직 배곳에서는 왜말을 가르치고 배웁니다. 거기다가 나라일꾼(공무원)들도 일본사람들이 쓰던 왜말을 그대로 쓰고 있으니, 배우는 아이들도 물들어 온 나라 모든 사람이 왜말살이하는 겨레가 되었습니다. 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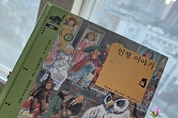
[ 배달겨레소리 숲하루 글님 ] 작게 삶으로 92 바라는 대로 《인형 이야기》 루머 고든 햇살과 나무꾼 옮김 비룡소 2023.9.28. 인형은 사람하고 달라요.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살아 있지만, 인형은 누군가 같이 놀아주기 전에는 정말로 살아 있는 게 아니랍니다. (65쪽) 여름에 《인형 이야기》를 장만하고서, 대구에서 시골로 오갈 적마다 꾸러미에 담고 다녔다. 으레 책상 한쪽에 두었다. 두고두고 읽은 느낌을 글로 적어 보는데, 깜빡 잊고 갈무리를 안 한 탓에 그만 글이 날아갔다. 어째 글도 갈무리를 안 해 놓고서 날린담 하고 혼잣말을 하다가 생각한다. 아마 처음부터 새로 쓰라는 뜻이지 않을까. 《인형 이야기》는 여러 ‘인형’하고 아이들이 마음을 나눈 이야기를 들려준다. 인형끼리 주고받는 마음을 마치 누가 옆에서 귀담아들은 듯한 이야기도 들려준다. 바라고 싶은 마음이 무엇인지 차근차근 짚는다. 그러고 보면, 아이들은 인형을 가슴에 폭 안고서 스스로 바라는 말을 끝없이 속삭이곤 한다. 아이들한테 ‘인형’이란 꿈을 비는 속마음을 말로 털어놓는 알뜰한 동무라고 할 수 있다. 어느덧 크리스마스를 앞둔다. 여섯 달 동안 《인형 이야기》를 책상맡에 놓고서 들여다보

[ 배달겨레소리 숲하루 글님 ] 작게 삶으로 091 숲내음 《들꽃내음 따라 걷다가 작은책집을 보았습니다》 최종규 스토리닷 2024.11.9. 책이름이 긴 《들꽃내음 따라 걷다가 작은책집을 보았습니다》를 다시 읽는다. 도시에 있는 책집에 들꽃내음이 있을까? 무슨 소리인가 갸웃거리며 읽다 보니, ‘들꽃내음’은 글쓴이가 일본 도쿄 책거리에 갔을 적에 겪은 일이다. 북적이는 곳도 아니고 큰길도 아닌 마을 안쪽, 골목이 이은 작은집이 잇달은 곳에 핀 들꽃을 보았고, 이 들꽃 곁에 서서 꽃내음을 맡고서 고개를 드니 바로 앞에 조그마한 책집이 있었다고 한다. 그곳은 바둑 전문책집이었고, 이 바둑 전문책집에서 뜻밖에도 우리나라 책을 여럿 만나서 놀랐다고 한다. 글쓴이는 ‘1벌 읽을 책’이 아닌 ‘적어도 100벌 되읽을 책’을 고른다고 한다. 아니, ‘100벌’을 넘어서 ‘300벌이나 1000벌 되읽을 책’이기를 바라면서 고른다고 한다. 그런데 책을 좋아하는 아이라고 해도 같은 책을 100벌이나 되읽을 수 있을까? 우리 집 셋째 아이는 만화책을 좋아해서 만화책에 나온 말을 외우면서 보고 또 보았는데, 스무 벌쯤 되읽지 않았나 싶다. 글쓴이가 출판사에서 일하며 국제도서전에서…

[ 배달겨레소리 숲하루 글님 ] 작게 삶으로 90 흉내 《한강》 한강 문학동네 2023.6.1. 올해 늦가을에 제주도에 다녀오면서 《한강》을 장만했다. 제주에서 보름살기를 하는 동안 제주 마을책집을 돌아보았고, 이때에 눈여겨보았다. 《한강》이라는 책에는 한강 씨가 쓴 소설과 시와 산문을 싣는다. 그런데 〈희랍어 시간〉을 읽으며 자꾸 흐름이 끊긴다. 소설에 나오는 사람들 이야기가 너무 길다. 뭔가 낱낱이 그리는 듯하지만 오히려 말만 너무 긴 듯해서 답답하다. 어제를 돌아보며 오늘을 빗대는 듯하지만 잘 모르겠다. 〈종이 피아노〉로 넘어간다. 어릴 적에 피아노를 하고 싶은데 집안살림이 안 되어서 종이 피아노를 놓고서 치던 이야기를 그린다. 그런데 한강 씨 아버지는 소설가이고 집에 책이 많았다. 피아노를 만질 수 없어서 종이 피아노를 눌렀다지만, 책이 잔뜩 있던 한강 씨네 살림이 오히려 부럽다. 나는 어릴 적에 교과서를 뺀 다른 책을 만지지도 보지도 못 했다.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 내가 배우고 싶으면 배워 보라고 피아노학원이라든지 다른 어느 곳도 보낼 수 없었다. 아마 보내려는 엄두조차 못 내었으리라. 의성 멧골마을에 무슨 학원이 있겠으며 무슨 책집이 있겠는가. 나
[ 배달겨레소리 숲하루 글님 ] 우리말 26 두드리다 수박이 잘 익었는지 톡톡 두드려요. 퉁퉁 소리라면 껍질이 두껍습니다. 통통 소리라면 잘 익었다는 대꾸입니다. 새로 지낼 시골집을 두드려 봅니다. 흙을 감싼 쇳소리가 납니다. 문을 두드려요. 들어가도 되는지, 얼굴을 보고 얘기할 수 있는지, 가만히 여쭈어요. 문틀을 망치로 두드려요. 못을 박아 갈대발을 얹어요. 낡고 벗겨진 거울을 살살 두드려요. 조각조각 내어 종이자루에 담아서 치워요. 잇고 싶어서 두드립니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라는 옛말이 궁금했어요. 단단한 돌로 놓았다지만 참말로 든든한지 천천히 밟아 봅니다. 그런데 밭둑에서 미나리를 뜯으려고 하다가 한발이 진흙에 푹 빠집니다. 처음부터 도랑에 들어갔으면 안 놀랐을 텐데 싶더군요. 두드려 본다는 뜻은 미리 살핀다는 얘기일 테지요. 모르니까 물어 물어 갑니다. 마음을 열고 싶어 두드립니다. 아직 모르는 하루를 종이에 사각사각 적습니다. 2024. 5. 7. 숲하루

[ 배달겨레소리 숲하루 글님 ] 작게 삶으로 89 보고 자라요 《머리를 자르러 왔습니다2》 타카하시 신 정은 옮김 대원씨아이 2021.9. 15. 《머리를 자르러 왔습니다 2》를 지난해 이맘때에 처음 읽었다. 시골에 가는 날이 잦아서 아예 책을 따로 꾸러미에 담아서 들고 다닌다. 움직이는 작은책집처럼 여긴다. 제주나들이에도 책꾸러미를 챙겼고, 이 책을 담는다. 이 책은 아빠가 아이한테 들려주기보다 보여주는 쪽이다. 혼자 살아가는 길에 익숙한 사람이 어느 날 아이를 낳았지만, 아이한테도 짝한테도 서툴렀다. 아이가 제법 자라서 초등학교에 들 즈음부터 갑자기 아이를 혼자 맡아야 한다. 어떻게 아이를 돌봐야 하는지, 이러면서 살림과 집안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도 모르던 젊은 사내가 비로소 어버이로 선다. 처음으로 아이 곁에 씩씩하게 서려고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어버이 마음을 만화로 담는다. 아이는 아빠가 해준 밥을 먹으면 힘이 난다. 아버지는 온마음을 담아 밥을 짓는다. 엄마도 아빠도 아이 키우는 일이 익숙하지 않았다는데, 으레 혼자 지내야 하면서 말이 없어진 아이인데, 아빠와 새롭게 둘이 살면서 아빠가 하는 일을 지켜보고, 섬마을에서 여러 이웃과 동무를…

[ 배달겨레소리 숲하루 글님 ] 작게 삶으로 88 즐거운 일 《이거 그리고 죽어 1》 토요다 미노루 이은주 옮김 대원씨아이 2024.4.23 지난달 시골에 머물 때 몇 권 들고 간 책 가운데 《이거 그리고 죽어 1》는 쉽게 읽었다. 만화라서 쉽게 읽었을까. 몸을 많이 쓰는 일을 하면서 짬이 없거나 지칠 적에 조금이나마 마음을 모아서 읽었다. 나는 고등학교를 다니던 때에 ‘작문’ 시간이 참 따분했다. 그렇다고 그때에 만화를 읽지도 않았다. 《이거 그리고 죽어 1》를 보면, 담임 교사가 아이한테 “만화 같은 건 그 어디에도 도움이 안 돼요!(22쪽)” 하고 말한다. 아마 나는 고등학교 때에 이렇게 여겼는지 모른다. 그때 어른들도 만화는 삶에 이바지하지 않는다고 여겼을 테고. 그렇지만 아이를 낳고 보니 달랐다. 막내는 만화책을 좋아했다. 읽고 또 읽고 외울 만큼 읽고 혼자 까르르 웃었다. 막내는 만화를 읽으면서 누나가 배우는 눈높이를 조금씩 알아갔다. 그래서 “만화는 거짓이 아니다(24쪽)” 하고 나오는 말에 고개를 끄떡끄떡한다. 가만히 보면 이 만화책은 ‘만화’를 말하는 줄거리인데, ‘만화’를 ‘시’나 ‘글’로 바꾸어서 읽을 만하다. 사람들은, 또 이 나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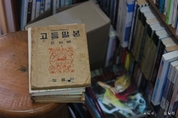
[ 배달겨레소리 숲노래 글님 ] 숲노래 책숲마실 지키는 돌보는 ― 경남 진주 〈형설서점〉 돈을 버니까 하는 일은 모든 사람을 좀먹습니다. 왜냐하면, ‘일’이라는 낱말은 ‘일다·일어나다’가 바탕이요, ‘일으켜서 잇는’ 결이 밑동이거든요. 바람이 일고 바다가 인다고 합니다. 밥을 지으려고 쌀을 입니다. 하면서 차근차근 이루어 가기에 ‘일’이요, 하는 동안 서로 이야기가 태어나기에 ‘일’입니다. 어깨에 이듯 차곡차곡 올리면서 살림을 넉넉하게 가다듬는 ‘일’입니다. 가만히 있는다면 어느새 고입니다. 고이는 결이라서 ‘고요’라고 합니다. 숨도 몸짓도 소리도 없는 ‘고요’인데, 그만 넋이나 빛이 사라지면 ‘고이’고 말아서 썪어요. 그저 꿈꾸는 씨앗이나 ‘고치’라면 머잖아 깨어날 텐데, 넋이나 빛이 사그라들면 죽음(썩음)으로 치닫습니다. 일이란, 마음을 잇고 손을 이으면서 땅을 일구고 서로 생각을 일으켜서 너울너울 싱그럽게 바람과 바다를 하나로 여미는 길입니다. 이러한 숨빛을 알아보려고 하지 않고서 돈바라기로 흐르는 오늘날 숱한 ‘일자리(직업)’는 오히려 모든 사람을 갉아요. 사랑바라기나 꿈바라기가 아닌 돈버러지로 치닫거든요. 진주에 깃들어서 〈형설서
[ 배달겨레소리 숲노래 글님 ] 하루 우리말 노래 우리말 새롭게 가꾸기 85. 흰웃옷 속에 받치는 흰빛인 웃옷이라면 ‘흰 + 웃옷’처럼 엮으면 어울린다. 우리나라는 아직 이 흰웃옷을 가리키는 말을 일본에서 받아들인 일본영어인 ‘와이셔츠’를 고지식하게 쓰는데, 영어조차 아니고 우리 삶하고도 동떨어진 엉뚱한 말씨는 얼른 걷어내야지 싶다. ‘셔쓰’냐 ‘셔츠’로 다툴 까닭이 없다. ‘웃옷·윗도리’라 하면 되고, ‘적삼·저고리’ 같은 우리말이 버젓이 있다. 흰웃옷(희다 + ㄴ + 웃 + 옷) : 속에 받치는 흰빛인 웃옷으로 깃이 있고 소매가 있으며, 깃에는 댕기를 맬 수 있다. 하늬녘 차림이다. (= 흰윗도리·흰적삼·흰저고리·하얀웃옷·하얀윗도리·하얀적삼·하얀저고리·저고리·적삼·윗옷·윗도리·위. ←셔츠shirt/샤쓰シャツ, 와이셔츠ワイシャツ·Yシャツ/white shirt·dress shirt/와이샤쓰) 86. 다리꽃 흔히 ‘장애인 이동권’을 말하는데, 그냥 ‘다리꽃’을 말해야 알맞다고 느낀다. ‘어린이 다리꽃’이며 ‘아기 다릿날개’를 펼 적에는 누구나 홀가분하면서 즐겁고 느긋하게 어디이든 오갈 만하다. 아기는 어버이가 안거나 업거나 아기수레에 태워야 길을 다닐 수 있다

[ 배달겨레소리 숲노래 글님 ] “숲에서 짓는 글살림”은 숲을 사랑하는 눈빛으로 시골자락에서 아이들하고 살림을 짓는 길에 새롭게 맞아들여 누리는 우리말 이야기입니다. 숲노래 우리말꽃 숲에서 짓는 글살림 47. 셈꽃 조선총독부에서 펴낸 배움책(교과서)을 보면 ‘算數’처럼 한자로 적습니다. 우리는 이 이름을 꽤 오래 썼고, 요새는 ‘수학(數學)’으로 쓰지요. 총칼수렁(일제강점기)이 끝난 뒤에 지긋지긋한 일본말 굴레에서 벗어난 만큼, 배움책을 새로 엮을 적에 끔찍한 일본 한자말을 걷어내자는 물결이 일었습니다. 이즈음 ‘셈본’이란 이름으로 교과서가 나왔어요. 이러다가 남북이 갈려서 싸움수렁이 불거졌고, 남녘에 군사독재가 서슬이 퍼렇게 으르렁대면서 ‘셈본’이란 이름은 짓눌려 사라져야 했고, ‘수학·산수’ 두 가지 이름만 나돌았습니다. ‘셈’이란 무엇일까요? ‘세다’는 어떤 결을 나타낼까요? 적잖은 분은 ‘셈’은 얕거나 낮은 낱말이요, ‘수학’이나 ‘계산’ 같은 일본 한자말을 써야 제대로 배우거나 가르칠 만하다고 여깁니다. 참말로 그럴까요? 우리는 ‘셈’이라는 낱말을 아직 모르거나 찬찬히 생각한 적이 없지는 않을까요? 셈(셈하다·셈나다) ← 계산, 산(算), 산수(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