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달겨레소리 숲하루 글님 ] 우리말 2 쪼개다 쪼개면 작습니다. 바위가 부서지면 돌이 되고, 돌을 쪼개어 자갈에 조약돌이에요. 비바람에 부서져 흙입니다. 돌멩이가 깎이면서 모래알입니다. 말도 잘게 쪼개어 마음을 담을 수 있습니다. 모래알 같거나 바위 같아도 기쁩니다. 마음에는 크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만 키우면 큰돌처럼 무겁습니다. 기쁘면 얼싸안고 손뼉을 치고 껑충껑충 뜁니다. 겉치레를 쪼개어 내면 어느새 날듯이 가볍고 그림이 또렷합니다. 겨울 기스락을 봅니다. 모래밭으로 밀려오는 물결이 쓸고 가면서 모래알은 촘촘하고 판판합니다. 출렁이며 밀려오는 물결이 바위에 부딪치니 하얗게 메밀꽃입니다. 글도 말도 삶도 쪼개어 보면, 할 말도 많고 자잘한 이야기도 많습니다. 작은 물줄기를 따라가면 모두 다른 삶결이 만나요. 한 꼭지 두 꼭지 다시 모읍니다. 조각보를 잇대어 꾸러미로 다시 태어납니다. 쪼개고 쪼개어도 알맹이는 그대로입니다. 2023.12.20. 숲하루

[ 배달겨레소리 숲노래 글님 ] 숲노래 노래꽃 / 숲노래 동시 내가 안 쓰는 말. 흥미 까투리 장끼는 새끼랑 놀고 암제비 수제비 하늘 가르는 앵두나무 푸른잎 싱그러운 한봄 개미집이 부쩍 크고 벌집도 자꾸자꾸 크는 오동나무 큰잎 시원스런 한여름 무화과알 까마중알 감알 깨 고추 콩 나락 그득한 잣나무 바늘잎 짙푸른 한가을 철맞이 누리면 재미있어 새노래 매미노래 구성져 한겨울에 날개 띄우자 눈꽃송이 신나게 받고 놀자 ㅅㄴㄹ ‘흥미(興味)’는 “흥을 느끼는 재미”라 하고, ‘흥(興)’은 “재미나 즐거움을 일어나게 하는 감정”이라는군요. 우리말로 하자면 ‘신·신명·신바람’이라고 하겠습니다. ‘신·신명·신바람’은 “시원한 빛”입니다. 시원하게 틔우는 빛이고, 시원하게 일어나는 빛이에요. ‘신’은 ‘시’가 말밑이고, ‘심(힘)’하고 말뿌리가 닿습니다. ‘심’은 ‘심다’하고 맞물리며, ‘심·심다’는 ‘씨·씨앗’하고 얽히는 낱말이지요. 씨앗을 심어서 기르듯 올라오는 힘이 빛나기에 ‘신·신명·신바람’이랍니다. 그래서 신나게 노는 동안 즐겁거나 재미있다고 느껴요. 신바람을 내니 새롭고 싱그럽습니다. 어떤 마음을 심으면서 천천히 올라오는 심(힘)인 ‘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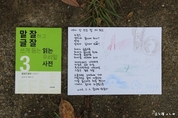
[ 배달겨레소리 숲노래 글님 ] 숲노래 노래꽃 / 숲노래 동시 내가 안 쓰는 말. 최고 하늘은 얼마나 높아야 하나? 땅은 얼마나 깊어야 하지? 하나가 높을수록 하나가 낮아야 한다 하나를 올릴수록 하나를 내려야 하지 개미한테도 나한테도 하늘은 그저 하늘 독수리한테도 너한테도 구름은 줄곧 구름 노을처럼 노래하며 간다 너울처럼 놀며 어울린다 가장 높으려는 허울 벗고서 가벼이 놓으며 하늘빛으로 ㅅㄴㄹ 누구를 높이면, 둘레에 누구는 저절로 낮추게 마련입니다. 높낮이나 앞뒤를 따지면, 첫째나 으뜸 둘레에 막째나 꼴찌가 있습니다. ‘최고(最高)’는 “1. 가장 높음 2. 으뜸인 것. 또는 으뜸이 될 만한 것”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첫째나 으뜸이란 자리가 나쁘지 않다면, 막째나 꼴찌라는 자리도 안 나쁘겠지요? 그저 자리를 갈라 놓을 뿐이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나라나 이웃나라를 보면, 으레 첫째나 으뜸만 눈여겨보거나 치켜세웁니다. 다들 첫째나 으뜸이 되려고 자꾸 겨루거나 싸우거나 다퉈요. 함께 걸어가는 길이나 어깨동무를 하는 살림살이가 아닌, 혼자만 떵떵거리려는 굴레 같습니다. 요즈음은 시골에서 살아가며 철마다 다르고 달마다 다르며 날마다 다른 풀꽃나
[ 배달겨레소리 숲하루 글님 ] 우리말 1 풀꽃 풀은 철마다 푸르게 자랍니다. 오늘은 다리를 지나면서 냇가를 바라보았습니다. 큰물에 말끔히 쓸려간 듯 자갈밭을 이루는 밭둑을 봅니다. 아직 겨울이라 풀이 돋지는 않습니다. 곧 봄을 맞이하면 푸릇푸릇 풀이 올라올 테지요. 풀은 작지만 찬바람에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겨울이 가라앉을 무렵에 돋는 냉이를 비롯한 봄맞이풀을 보며 설렙니다. 풀이 돋는 곳에는 꼭 꽃이 있습니다. 먼저 줄기가 나오고, 잎이 퍼지면서, 꽃이 핍니다. 언제나 ‘풀’이면서 ‘풀꽃’입니다. 모든 풀은 꽃을 품은 푸른빛입니다. 나는 이 풀꽃을 좋아합니다. 나는 이 풀꽃이 퍼뜨리는 작은 풀씨를 좋아합니다. 풀꽃을 닮은 우리말을 좋아합니다. 봄볕을 머금고서 온누리를 푸르게 덮는 풀꽃처럼 우리가 쓰는 말도 푸르게 빛나기를 바랍니다. 풀 한 포기는 굳이 꾸미지 않으면서 싱그럽듯, 꾸밈없이 쓰는 우리말도 아름답습니다. 2023.12.20. 숲하루
[ 배달겨레소리 숲노래 글님 ] 하루 우리말 노래 우리말 새롭게 가꾸기 66. 나래꽃 ‘우표(郵票)’는 일본이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퍼뜨렸다. 우리나라로서는 하나부터 열까지 스스로 만들거나 짜거나 짓기 어렵던, 아니 모조리 이웃나라한테서 받아들여서 써야 하던 지난날이었으니 어쩔 길이 없었으리라. 일본사람이 지어서 퍼뜨렸기에 안 써야 할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일본을 안 거치고서 ‘postage stamp’나 ‘stamp’를 곧바로 받아들여서 나누려 했다면 어떤 이름을 지었을까? 아무래도 1884년에는 한자를 썼을 만하지만, 글월을 글자루에 담아 띄울 적에 “훨훨 날아간다”는 뜻으로 ‘나래·날개’ 같은 낱말을 살려썼을 수 있다. 글월을 ‘보내다’라고만 하지 않고 ‘띄우다’라고도 하기에, ‘띄우다 = 날려서 가다’라는 얼거리를 돌아볼 만하다. 글월을 띄우는 값을 미리 치러서 붙이는 종이는 작다. 테두리가 오돌토돌하다. “작은 종이꽃”으로 여길 만하다. “날아가는 작은 종이꽃”이기에 ‘날개꽃·나래꽃’처럼 새롭게 가리킬 수 있다. 어느덧 ‘우표’를 쓴 지 한참 지났어도, 우리 나름대로 새길을 찾는 새말로 새꽃을 피울 만하다. 날개꽃 (날개 + 꽃) : 글월을 부칠 적
[ 배달겨레소리 숲노래 글님 ] 하루 우리말 노래 우리말 새롭게 가꾸기 61. 온살 100이라는 셈을 우리말로는 ‘온’으로 센다. 우리말 ‘온’은 ‘모두’를 나타내기도 한다. ‘온누리·온나라’는 “모든 누리·모든 나라”를 가리킨다. ‘온몸·온마음’은 “모든 몸·모든 마음”을 뜻한다. 나이로 ‘온(100)’에 이를 적에는 모두 헤아리거나 보거나 느끼거나 안다고 여긴다. 더없이 참하고 어질다고 여기는 ‘온살’이요, 어느덧 ‘온살이날’이나 ‘온살림길’로 바라본다. 온살 (온 + 살) : 온(100)에 이른 나이. 오래 살아온 날. 오래 흐르거나 이은 나날. (← 백세百歲) 온살림날 (온 + 살리다 + ㅁ + 날) : 온(100)에 이르도록 살아온 나이. 오래 살아오거나 살아가는 길·날. 오래 흐르거나 이으며 누리거나 짓는 길·나날. (= 온살림길·온삶길·온살이길·온살이날·온삶날. ← 백세시대) 62. 오늘눈 바로 여기에 있는 이날이 ‘오늘’이다. 지나간 날은 ‘어제’이고, 다가올 날은 ‘모레’이다. 우리는 어느 날 어느 곳에 있느냐에 따라 눈길이 다르다. 오늘 이곳에서 바라보는 ‘오늘눈’이라면, 지나간 날에 지나간 그곳에서 바라보려는 ‘어제눈’이며, 앞으로 맞이할
[ 배달겨레소리 숲노래 글님 ] 하루 우리말 노래 우리말 새롭게 가꾸기 57. 담찔레 지난날에는 울타리를 가볍게 두면서 탱자나무나 찔레나무나 싸리나무를 ‘울나무’로 삼았다. 탱자한테서는 하얗고 맑은 꽃을 보다가 노랗고 탱탱한 열매를 얻는다. 찔레한테서도 하얗게 그윽한 꽃을 맞이하는데, 이에 앞서 새봄에 돋는 여린싹을 나물로 얻는다. 싸리나무한테서는 겨울에 눈을 쓸거나 여느 철에는 마당을 쓰는 빗자루로 묶을 가지를 얻는다. 울나무 가운데 하나인 ‘찔레’를 눈여겨본 사람들은 꽃송이만 따로 키워 “꽃빛을 크게 누리는” 길을 열었다. 이러며 ‘rose’라는 이름을 붙이고 한자말로는 ‘薔薇’로 옮기는데, 우리 눈썰미로 보자면 ‘꽃찔레’이다. 꽃으로 누리는 찔레란 뜻이다. 이 꽃찔레는 으레 담에 올려서 잇는다. 담을 타고 덩굴을 뻗는 꽃빛이다. 그러면 ‘담찔레’로 이어가기도 한다. 담찔레 (담 + 찔레) : 찔레(들찔레)를 바탕으로 사람들이 손보고 따로 키우면서 꽃송이가 더욱 눈부시며 크도록 가꾼 꽃을 가리키는 이름. 으레·일부러 담에 앉혀서 덩굴줄기를 이으면서 함박스럽게 커다란 꽃송이를 나누거나 누리기도 한다. 꽃송이가 눈부시게 돋보이도록 바꾼 꽃인 ‘장미’를 가리키
[ 배달겨레소리 숲노래 글님 ] 하루 우리말 노래 우리말 새롭게 가꾸기 53. 옷나래 예부터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다. 옷을 갖춘 모습으로 달라 보일 수 있다고 여긴다. 어떤 차림새여도 아랑곳하지 않으면서 속빛을 읽을 수 있고, 새롭게 차리면서 힘을 낼 수 있다. 옷이 날개나 나래가 된다면, 옷이 꽃이 될 만하리라. 옷으로 드러내는 멋이나 맵시가 있고, 마음멋이나 마음꽃이나 마음날개를 펼 수 있다. 옷나래 (옷 + 나래) : 옷이 나래·날개. 나래·날개 같거나, 나래·날개를 단 듯한 옷이나 옷차림. 겉으로 보거나 느끼는 옷이나 모습. 옷으로 꾸미거나 차리거나 보여주는 모습. 틀에 가두거나 갇히지 않고서, 마음껏 입거나 즐기거나 누리는 옷. (= 옷날개·옷멋·옷맵시·옷꽃·옷이 나래·옷이 날개. ← 패션, 패션감각, 패션복장, 패션디자인, 핏fit, 복식服飾, 복색服色, 복장服裝, 의관衣冠, 인상착의, 코디coordination, 외外, 외적外的, 외부, 외면外面, 외관, 외모, 외양外樣, 외장, 외형, 외견, 코스프레コス-プレ, 코스튬 플레이, 교복자율화, 교복자유화, 자유복자유복장) 54. 새바라기 해를 바라보니 ‘해바라기’이다. 가뭄이 길어 비를 바라니
[ 배달겨레소리 숲노래 글님 ] 하루 우리말 노래 우리말 새롭게 가꾸기 49. 함박구름 크고 시원하게 웃으니 ‘함박웃음’이다. 크고 시원하게 피는 ‘함박꽃’을 닮은 웃음이라고 여긴다. ‘함박’은 ‘하·한’이 말밑이요, ‘하늘·크다·하나’를 밑뜻으로 담는다. ‘한바탕·함께·함함하다’도 말밑과 밑뜻이 같다. 이런 얼거리를 헤아리면, 크고 시원하게 내리는 ‘함박눈·함박비’에 ‘함박구름·함박물결’처럼 새말을 여밀 수 있다. 함박 ㄴ (함지박) : 1. 속에 넉넉히·잔뜩·많이 담을 수 있도록 통나무를 둥그렇게 움푹 파서 쓰는 그릇. 2. 겉으로 드러나는 길이·넓이·높이·부피 같은 모습이 여느 것·다른 것보다 더 되거나 더 있거나 넘거나 넉넉히 남을 만하다. 함박구름 : 굵고 크게 피어난 구름. 50. 집안사람 집에 있기에 ‘집사람’이라면, 집안을 이루기에 ‘집안사람’이다. 바깥일을 하니까 ‘바깥사람(바깥양반)’으로 일컫기도 하는데, 바깥일을 한참 하더라도 언제나 집으로 돌아온다. 우리는 누구나 ‘집사람’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러한 결을 살리도록 ‘집안(집 + 안) + 사람’처럼 새말을 여미어 본다. 사잇말을 바꾸어 ‘집꽃사람’이라 하면 어떨까? 한집안을 포근히 이루면
[ 배달겨레소리 숲노래 글님 ] 하루 우리말 노래 우리말 새롭게 가꾸기 45. 길불 건너는 길목이라면 ‘건널목’이다. 건널목에 놓은 불이라면 ‘건널불’이다. 그러나 적잖은 어른들은 ‘건널목’이라는 쉬운말이 아닌 ‘횡단보도’라는 일본스런 한자말을 쓴다. 또한 건너는 길목에 놓는 불을 ‘건널불’이라는 쉬운말이 아닌 ‘신호등’이라는 일본스런 한자말로 가리킨다. 길을 밝히는 불은 어떤 말로 가리켜야 쉽고 어울릴까? 길을 밝히는 불빛 같은 사람은 어떤 말로 빗대면 어우릴까? 서로서로 ‘길불’이 되고 ‘길빛’으로 어깨동무할 수 있다. 길불 (길 + 불) : 길을 알리거나 보여주거나 밝히거나 이끄는 불·빛·사람·일. 어떻게 가거나 어디로 가야 하는가 잘 안 보이거나 어둡다고 여길 만한 때에, 어떻게 가거나 어디로 가면 되는가를 밝히거나 알리거나 들려주거나 이끄는 불·빛·사람·일. (= 길불빛·길빛. ← 신호등信號燈, 가로등, 등대燈臺, 지도指導, 지도자, 인도引導, 인도자, 지표指標, 지침, 감독, 필두, 선배, 인생 선배, 가이드라인, 구심求心, 구심점, 랜드마크, 지세地勢, 지형, 지형지물, 축軸, 어드바이스, 선생, 은사恩師, 강사, 교사敎師, 교원敎員, 교직敎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