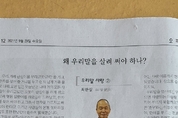
[ 배달겨레소리 한실 글님 ]--- 이 글은 한실님이 울산제일일보에 여섯 차례에 걸쳐 싣는 글입니다. 우리말살이는 겨레와 나라를 바로 세우는 바탕이다 1. 우리말살이란 무엇인가? 우리겨레가 우리말살이를 해야 한다고 누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 한사람 한 사람이 나날살이에서 즐겨 쓰는 말이 우리말일까요? 우리말을 쓰고 살아가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고 따져보면 우리말살이한다고 떳떳하게 말할 사람이 드물 것입니다. 이 일을 깊이 따져보려면 우리말살이가 무엇이며 또 우리말은 무엇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우리말살이란 무얼 말하는가?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자면 다른 이들과 어울려 말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데 나누는 말마디가 우리말이냐는 겁니다. 우리말을 쓴다는 말은 우리말로 말하고 우리말로 생각하고 우리말로 꿈꾸고 우리말로 쓴 글이나 책을 읽고 산다는 뜻입니다.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라고 말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말이 무엇인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우리가 쓰는 말은 다 우리말일까요? 요즘은 조금 한풀 꺾인 것 같기는 하지만, 많은 사람이 아내를 와이프라 일컫습니다. 오늘날 널리 쓰는 말 와이프가 우리말일까요? 아무도 와이프가 우리말이라고 생각
[ 배달겨레소리 한실 글님 ] 가¹: 【이】 1. 어떤 곳 가운데가 아닌 옆이나 끝께 ㉥ 바닥가 / 길가에 핀 민들레 꽃 2. 어떤 곳 가까운 둘레 ㉥ 우물가에서 놀지 마라 가²: 【토】 어떤 말에 붙어, 그 말이 임자말이 되게 하는 말 ㉥ 매가 하늘 높이 떠 있다 가가호호: → 집집마다 가감승제: →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가건물: → 까대기 가게: 【이】 여러 가지 것들을 벌려놓고 파는 집 ← 상점, 점방, 점포 ㉥ 집 앞 가게에서 빵 두 낱을 샀다 가격: → 값 가격표: → 값쪽종이 가계(家系): → 핏줄흐름, 집안내림 가계(家計): → 집안살림 가곡(歌曲): → 노래, 소리 가공(加工): → 손질, 만들기 가공(架空): → 꾸밈, 거짓 가공식품: → 손질 먹거리 가공(可恐)하다: → 엄청 두렵다 가관(可觀)이다: → 비웃음 살만하다 가구(家口): → 집 가구(家具): → 살림살이, 세간 가구점: → 세간 가게 가급적: → 할 수 있으면, 될 수 있으면 가까스로: 【어】 애를 써서, 겨우 ㉥ 밥을 먹자마자 달려서 가까스로 버스에 탔다 가까이: 【어】 1. 어떤 곳에 가깝게. [맞] 멀리 ㉥ 나한테 가까이 오너라 2. 서로 사이좋게 ㉥ 솔이네와
[ 배달겨레소리 한실 글님 ] 가고리(고구려)에서 소수림 임금 두해(372해)에 쫑궈 전진을 따라 태학을 세우고 한자와 한문을 가르친 것이 우리 겨레 첫 배곳이라고 한다. 그 뒤 시라(신라)와 온다라(백제)도 쫑궈 당나라를 따라 대학을 세워서 한문과 한자를 가르쳐 한자를 익힌 사람들을 벼슬아치로 뽑아 썼고..... 그 뒤 고리(고려) 때 국자감, 조선 때 성균관을 세워 똑같이 한자와 한문을 가르치고 이것을 깨친 사람들을 뽑아 나랏일을 맡겼다. 제 겨레말을 가르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오직 한자와 한문을 가르치다 보니 나라힘과 겨레힘은 여릴 대로 여려져 끝내는 섬나라 종살이까지 하게 되었다. 또 종살이 때는 왜사람들이 학교를 세워서 왜말을 가르치고 그것을 깨친 사람들을 써서 나라를 다스렸다. 이 흐름은 오늘에까지 이어져 학교에서는 내내 한글왜말을 가르치느라 우리말은 가르칠 엄두조차 못낸다. 그러니, 학교를 안가면 모를까 다녔다 하면 왜말을 으뜸으로 배워서 끝내 온 겨레가 누구나 왜말을 쓰고 사는 누리가 되었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말을 가르치고 배우게 하려면 학교는 모두 문을 닫고 배곳을 새로 열고, 국어라는 이름을 붙인, 왜말을 가르치는 일은 그만두고 나라말을
[ 배달겨레소리 한실 글님 ] 1. 사생이나물: 사양나물, 생치나물이라고도 한다. 이런 우리말 나물이름보다 전호나물로 더 널리 알려져 있다. 그늘을 좋아해서 냇가 나무 그늘에 많이 난다. 이른 봄에 눈이 녹자마자 또는 얼었던 땅이 녹자마자 머리를 내미는 나물이다. 내가 사는 백두대간 사벌고을에선 가장 먼저 올라오는 봄나물 가운데 히나디. 미나리 같이 생겼고 맛과 내음이 좋아 여러 사람 사랑을 받는다. 요즘 한창 뜯는 나물이다. 날로 먹어도 되지만 데쳐서 쌈 싸먹거나 무쳐먹으면 더 제 맛이다. 잎이나 어린 싹보다 제법 자라서 꽃대가 올라왔을 때 그 꽃대가 가장 맛이 좋다. 미나리 대궁 맛이 가장 좋은 것과 같다. 여러해살이풀이다. 2. 놀기서리: 원추리라고 널리 알려져 있다. 서라벌 고장 말로 놀기서리라 한다. 노란 꽃이 피는 애기 놀기서리, 놀기서리, 큰 놀기서리가 있고 누르붉은 꽃이 피는 임금 놀기서리가 있다. 임금 놀기서리는 밑동이 통통하고 굵으며 맛이 더 좋다. 놀기서리는 데쳐 무쳐 먹거나 데쳐 된장국을 끓여먹으면 맛있다. 놀기서리는 날 것으로 먹으면 독이 좀 있어 물똥을 누게 되거나 게울 수도 있어 꼭 끓는 물에 한소끔 데쳐서 먹는다. 여러해살이풀이라
[ 배달겨레소리 한실 글님 ] 외갓집, 외할머니, 친가, 친할머니, 시가, 시어머니, 처갓집, 장인, 장모, 언제부터 이런 말이 우리말살이에 자리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 삶에 맞게 바꿔 써가면 좋겠어요. 외갓집은 어미집, 또는 엄마집.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는 어할머니, 어할아버지. 친가집은 아빠집, 아비집, (친)할머니, (친)할아버지는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 시갓집은 시집.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우리말이고, 시부모는 시어버이. 처갓집은 가시집, 각시집, 아내집, 또는 꽃집. 장인, 장모는 가시아버지, 가시어머니, 아내아버지, 아내어머니, 꽃아버지, 꽃어머니.(가시는 꽃 옛말) ‘처’가 들어간 모든 말은 아내나, 가시로 바꾸면 되겠어요. 시동생 또는 시아우, 시누이는 우리말이니 그대로 쓰면 되고요. 또 초갓집, 외갓집, 처갓집 할 때 가(家)는 집가이니, 모두 겹말이지요. 따라서 풀집, 도는 짚집, 어미집, 아내집으로 바꿔 불러야 바르겠지요.
[ 배달겨레소리 한실 글님 ] 올해 봄이 좀 일찍 오는가 싶다. 겨울 날씨가 제법 추운 것 같았는데, 봄나물 올라오는 것을 보면 아무래도 지난 겨울은 따뜻한 겨울이었나 보다. 가장 먼저 올라오는 것은 아무래도 냉이와 꽃다지이다. 볕살 바른 곳은 벌써 제법 자라 잎이 파릇파릇하다. 냉이야 워낙 잘 알려진 나물이라 즐겨 먹기도 하고 저자에도 많이 나와서 누구나 잘 알지만, 꽃다지는 작기도 하려니와 요즘은 모르는 이들이 많은 것 같다. 옛날엔 첫배곳(초등) 책에 ‘달래, 냉이, 꽃다지 모두 캐보자.’ 란 노랫말이 있을 만큼 널리 알려진 나물이었는데,,,. 꽃다지는 데쳐서 나물로 해 먹으면 오줌을 잘 나오게 하고 염통을 튼튼하게 한다고 일러 내려온다. 쑥과 돌잔꽃풀(개망초)도 뒤질세라 머리를 내민다. 어저께 촉촉이 내린 단비님을 맞고 어제 오늘 사이에 참말 쑥이 쑥 올라온 느낌이다. 쑥은 뭐니뭐니해도 이른 봄에 막 올라오는 놈을 뜯어 쑥국을 끓여 먹으면 제맛이다. 봄내음, 첫 봄맛을 맛보는 지름길이다. 저는 마녘에서 널리 쓰는 개망초란 말보다 노녘에서 쓰는 돌잔꽃풀이란 이름이 더 좋은데, 돌잔꽃풀은 처음 아메리카에 살던 풀인데 우리나라에 들어와 들이고 메고 어디든
[ 배달겨레소리 한실 글님 ] 주검 - 죽은 사람 몸. 움직씨 ‘죽(다)’에 ‘엄’이 붙어서 된 이름씨. 죽+엄>주검. 비슷한 보기로 ‘무덤’이 있음. (<ㅡ시체, 시신, 송장) ㉥곰나루터 싸움이 끝난 뒤 곳곳에 주검이 널려있었다. 줄다 - 1.넓이나 부피가 작아지다. ㉥입던 바지가 바짝 줄어서 못 입게 되었다. 2.수나 양이 적어지다. ㉥며칠 굶었더니 몸무게가 줄었다. 3.기운이나 힘이 나빠지거나 없어지다. ㉥그이는 나이가 일흔을 넘겼지만 일하는 힘이 줄지 않았다. 4.살림이 어려워지다. ㉥돌림앓이 때문에 장사를 할 수 없어 살림이 줄었다. 지내다 - 살아가다. ㉥그는 몇 해를 가난하게 지냈다. 짊다 - 짐을 뭉뚱그려서 지게 같은 데 얹다. ㉥물걸이를 얹은 지게를 짊어지고 내려왔다. 짓마다 - 1.짓이기다시피 마구 몹시 잘게 부스러뜨리다. ㉥마늘을 짓마아서 갈치조림에 넣었다. 2.흠씬 마구 두들기다. ㉥북어를 도마 위에 놓고 방망이로 짓마았다. 짙다 - 가진 것이 넉넉하게 남아 있다. ㉥짙은 천량(한아비로부터 물려 내려오는 많은 살림살이) 짚다 - 1.지팡이나 손을 바닥에 대고 버티어 몸을 가누다 ㉥지팡이를 짚은 늙은이 2.손을 대어 살며시 누르
[ 배달겨레소리 한실 글님 ] 옹당이 – 땅바닥이 옴폭 패어 물이 괸 곳. ‘웅덩이’ 작은말. ㉥옹당이를 파야 개구리가 뛰어든다. 옹이 – 1.나무 줄기에 가지가 났던 자리. ㉥소나무를 캐면 옹이자리는 빛깔이 곱다. 2.굳은살을 빗대어 하는 말. ㉥손바닥에 옹이가 박혔다. 3.귀에 박히거나 가슴에 맺힌 마음. ㉥어머니 꾸중 한 마디가 가슴에 옹이가 되어 남았다. 우금 - 시냇물이 빠르게 흐르는, 가파르고 좁은 멧골짜기. ㉥사람 발길이 끊긴 우금에 숨어서 산 지 두해가 넘었다. 우련하다 - 흐릿하게 겨우 보이다. 보일 듯 말 듯 흐릿하다. ‘오련하다’는 작은말. ㉥꽃 지는 그림자 뜰에 어리어 하얀 미닫이가 우련 붉어라. 욱다 - 안으로 우그러져 있다. ‘옥다’ 큰말. ㉥기둥이 욱어서 볼품이 없다. 욱이다 - 안쪽으로 우그러지게 하다. ‘욱다’ 하임꼴. ㉥그래도 그렇지 욱인다고 채반이 용수될까? 울그다 - 억지로 내놓게 하다. ㉥여러 사람이 그 사람 가진 것을 울거먹었다. 웃비 - 아직 비가 올듯하나 좍좍 내리다가 잠깐 그친 비. ㉥웃비가 걷자 해가 반짝하고 비쳤다. 웃자라다 - 푸나무가 지나치게 자라다. ㉥더운 날씨로 보리가 웃자라 걱정이오. 으깨다 - 굳은
[ 배달겨레소리 한실 글님 ] 앙갚음 - 남이 저에게 해를 주었을 때, 저도 남에게 해를 주는 일. ㉥남에게 못된 짓을 하면 언젠가는 앙갚음을 받게 된다. 얕보다 - 있는 그대로보다 낮추어보다. ㉥사람을 얕보는 버릇이 있다. 얕잡다 - 남을 낮추어보아 하찮게 여기다. ㉥나를 얕잡아 보던 아이들이 매운맛을 봤지. 어름 - 두 몬 끝이 닿은 자리. ㉥하늘과 땅이 맞닿은 어름. 어리대다 - 아무 까닭 없이 어정거리다. ㉥샘방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 앞에서 어리대고 있었다. 어림 - 대충 겉대중으로 헤아림. ㉥그날 모꼬지에 왔던 사람들이 어림으로 온(백) 사람은 되었다. 어림잡다 - 어림으로 대충 헤아려보다. ㉥어림잡아 스무 살쯤 되어 보였어. 어정거리다 - 1.어줍게 천천히 거닐다. ㉥돈이 없어 밥집 앞을 어정거리다. 2.할일 없이 거닐다. ㉥저녁 먹고 집 앞 길을 어정거렸지. 어줍다 - 말이나 짓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어색하다. ㉥어줍은 말씨. 억수 - 물을 퍼붓 듯 세차게 내리는 비. ‘악수’는 작은말. ㉥비가 억수로 쏟아져 잠깐 사이에 온 들이 물바다가 되었다. 언걸 – 남 때문에 입는 괴로움. ㉥그는 내 언걸로 반쯤 죽게 되었다. 언걸먹다 – 언걸입어
[ 배달겨레소리 한실 글님 ] 설다 - 익숙하지 못하다. ‘설’을 길게 소리 냄. ㉥낯이 설다. ㉥메 설고 물 설은 넘마을. ㉥선 굿쟁이 사람 잡는다. 섧다 - 마음이 답답하고 슬프다. ‘서럽다’와 같은 말. 이름씨는 ‘설움’. ㉥섧고 외로워 못살겠다. 섶 – 섶나무, 잎나무, 풋나무, 물거리 들을 통틀어 일컫는 말. ㉥섶을 지고 불로 들어가려 한다. 속다 - 배게 나 있는 것을 군데군데 뽑아 성기게 하다. ㉥오늘 아침 밭에서 솎아 온 열무로 김치를 담갔다. 손어림 - 손으로 쥐어보거나 만져보고 대충 헤아림. (한)손대중. ㉥그이는 어둠속에서 손어림으로 성냥을 찾아 불을 켰다. 솔다¹ - 넓이나 폭이 좁다. ‘너르다’와 맞선말. ㉥저고리 품이 조금 솔다. 솔다² - 헌데나 다친 데가 말라서 굳어지다. ‘솔’을 길게 소리 냄. ㉥그 약을 발랐더니 다친 데가 곧 솔았다. 솟보다 - 몬을 잘 살피지 않고 비싸게 사다. ㉥찬찬히 뜯어보는 바탈이 아니어서 솟보는 일이 가끔 있다. 쇠다 - 끝을 지나쳐서 나빠지다. ㉥감기가 쇤 것뿐이니 걱정하지 마시오. 숙다 - 앞으로 기울어지다. ㉥익은 벼 이삭은 절로 숙는다. 숫구멍 - 갓난아기 정수리가 채 굳지 않아서 숨 쉴 때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