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배달겨레소리 숲노래 글님 ] 숲노래 노래꽃 / 숲노래 동시 내가 안 쓰는 말. 신문 어제하고 똑같이 굴고 그제처럼 되풀이하면 오늘이 새롭기보다는 쳇바퀴를 돌겠지 새로 밝아오는 새벽에 씨앗 그리는 아침에 나로서 살아가는 낮에 별빛을 품는 밤에 멧새노래에 귀를 연다 풀꽃나무에 눈을 뜬다 해바람비에 몸을 둔다 들숲바다에 말을 놓고 살리는 이야기가 밝아 살림짓는 하루가 맑아 사랑하는 우리가 기뻐 생각하는 글줄로 배워 ㅅㄴㄹ 날마다 나오는 이야기꾸러미를 가리키는 이름이 여럿 있으니, ‘일보’에 ‘신문(新聞)’이 있습니다. 낱말책은 ‘신문’을 “1. 새로운 소식이나 견문 2. 사회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사실이나 해설을 널리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한 정기 간행물”로 풀이합니다. ‘새얘기 = 신문’이란 얼거리인데, “새로운 이야기”라 하지만, 정작 하루가 다 지나지 않아도 낡거나 묵거나 지난 이야기로 잊히기 일쑤입니다. 날마다 궂거나 아프거나 고단한 이야기가 쏟아지기에 ‘오늘 아닌 어제 이야기’조차 잊으려고 할는지 모르는데, 이야기꾸러미 이름부터 아직 우리 나름대로 새롭게 가꾸려는 마음이 깃들지 않은 탓도 있다고 느껴요. ‘새뜸(새로 뜨다. 새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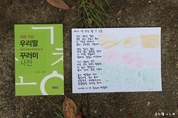
[ 배달겨레소리 숲노래 글님 ] 숲노래 노래꽃 / 숲노래 동시 내가 안 쓰는 말. 노동 네가 흘리는 땀은 볼을 타고 등줄기 흘러 이 땅을 적시더니 흙이 보슬보슬 기름지다 네가 들이는 품은 손길 닿고 발걸음 담아 이 마을 보듬더니 집마다 즐겁고 아늑하다 네가 펼치는 일은 서로 잇고 함께 일렁여 이 숲이 푸르더니 뜻이 있게 꿈을 이룬다 같이 땀흘리고 쉬자 품앗이로 풀고 놀자 일동무는 노래하는구나 살림벗은 하루를 짓네 ㅅㄴㄹ 일본에서 퍼뜨린 한자말 ‘노동(勞動)’은 ‘노동자’나 ‘노동부’ 같은 데에 붙어서 널리 퍼집니다. 우리말 ‘일’은 차츰 멀리하거나 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낱말책에서 ‘노동·일’이란 낱말을 찾아보는 분은 몇이나 될까요? 한자말 ‘노동 = 몸을 움직여 일을 함’을 뜻합니다. 이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꾼·일터·일빛·일자리·일판·일꽃·일동무’처럼 ‘일’ 쓰임새를 못 넓히는 판입니다. 우리말 ‘일’은 열 가지 넘는 뜻하고 쓰임새가 있어요. 이 가운데 첫째는 “뜻하거나 바라거나 그리거나 일어나거나 맞이하는 모든 것. 물결이 일듯, 하루가 일어나듯, 몸을 일으키듯, 어제하고 오늘이 잇듯, 첫밗으로 나아가는 길이 ‘일’”이라고
[ 배달겨레소리 숲노래 글님 ] 하루 우리말 노래 우리말 새롭게 가꾸기 29. 봉긋·바위 우리말 ‘벙어리’는 ‘벙긋벙긋’하는 모습을 고스란히 담은 이름이다. ‘벙글벙글’ 웃는 몸짓은 소리를 내지 않는다. ‘싱글벙글’도 마찬가지이다. ‘벙글·빙글·빙그레’를 깎음말(차별어)로 여기지 않는데, ‘벙어리’란 우리말만 깎음말로 여긴다. 그러면 더 생각해 본다. 차라리 새말을 여미면서 새뜻을 밝히고 새길을 알려 보자. ‘벙긋·벙글’처럼 소리를 내지 않듯 가만히 웃음짓듯 벌어지는 꽃송이를 ‘봉오리’라 하고, 봉오리는 ‘봉긋’ 솟거나 핀다고 여긴다. 이러한 뜻과 결을 담고, 뜻풀이에서도 찬찬히 밝혀 ‘봉긋님’ 같은 이름을 쓸 수 있다. ‘바위님’이라는 낱말에도 새뜻과 새결과 새숨을 담아서 함께 쓰자고 할 수 있다. 봉긋님 (봉긋 + 님) : 소리를 내지 않거나 말을 하지는 않는 사람. 피어나는 봉긋봉긋한 봉오리처럼, 고요하면서 맑게 숨빛을 품은 사람. (= 바위님. ← 청각장애인·언어장애인) 바위님 (바위 + 님) : 소리를 내지 않거나 말을 하지는 않는 사람. 커다랗고 단단하게 삶터를 버티는 바위나 멧자락처럼, 넉넉하고 푸르게 숨빛을 품은 사람. (= 봉긋님. ← 청각장

[ 배달겨레소리 숲노래 글님 ] 숲노래 노래꽃 내가 안 쓰는 말. 남자 남자란 바보같은 놈이야 스스로 못 깨닫고 곁에서 알려주면 뒷북이지 남자란 나무로 설 수 있고 날개를 펼 수 있고 노래를 할 수 있어 남자란 날(낳을) 적에는 아직 몰라도 날(나을) 적에는 확 달라지지 너도 알 테야 나긋나긋 알려주렴 느긋느긋 속삭이렴 온 나날을 사랑으로 너나없이 우리로서 ㅅㄴㄹ ‘남자’는 ‘男子’처럼 한자를 적습니다. ‘밭(田) + 힘(力)’입니다. 우리말로는 ‘가시버시’에서 ‘버시’가 ‘남자’요, ‘버시 = 벗’이며, 시골말로는 ‘머스마(머스매)’이고, 이 오랜 우리말은 ‘머슴’하고 맞닿습니다. ‘머슴’이란, 스스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닌, 남이 시키는 일을 맡아서 해주고는 일삯을 돈이나 밥으로 받는 사람을 가리키는데, 머슴이란 일꾼은 ‘사내(남자)’입니다. 곧, 우리말 ‘머슴’이나 한자말 ‘男子’나 “시키는 일을 고분고분 힘으로 맡는 사람”인 셈입니다. 우리말이나 한자말이 왜 이런 밑뿌리를 낱말에 담았는가 하고 돌아본다면, 참말로 사내(돌이·남자)는 처음부터 스스로 생각해 보기보다는 남(순이·여자)이 들려주는 말과 모습에 따라 달라져요. 나이를
[ 배달겨레소리 숲노래 글님 ] 하루 우리말 노래 우리말 새롭게 가꾸기 25. 키잡이 우리말 ‘키’는 세 가지이다. 첫째는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길이를 살피는 ‘키 ㄱ’이요, 둘째는 낟알을 까부르는 살림인 ‘키 ㄴ’이고, 셋째는 배가 나아갈 길을 잡는 자루인 ‘키 ㄷ’이다. 세 가지 ‘키’ 가운데 ‘키 ㄷ’은 ‘키잡이’로 말씨가 뻗는다. 이끌거나 가르칠 만한 키잡이라고 할 만하다. 나아갈 곳을 알리거나 밝히는 키잡이요, 길을 잡거나 찾는 실마리인 키잡이라고 하겠다. 키잡이 (키 + 잡다 + -이) : 1. 배가 나아갈 곳을 잡거나 이끄는 살림. 2. 앞으로 가거나 나아갈 곳·길·흐름을 잡거나 이끄는 일이나 말이나 사람. (= 키·키를 잡다. ← 방향, 방향타, 방법, 법法, 방안, 방책方策, 방도, 수단手段, 대안, 플랜B, 대책, 노선, 노정路程, 도정道程, 선택, 목적, 목표, 지도指導, 교육, 교훈, 교화, 교리敎理, 교수敎授), 강사, 교사敎師, 선생, 은사恩師, 교양敎養, 교도敎導, 교정矯正, 교습, 레슨, 훈육, 훈련, 훈수, 훈계, 훈장訓長, 계몽, 계도, 사사師事, 어드바이스, 권고, 권하다, 장려, 충고, 코치, 양성養成, 소양, 양육, 육영,
[ 배달겨레소리 숲노래 글님 ] 하루 우리말 노래 우리말 새롭게 가꾸기 21. 튀김닭 감자를 튀기면 ‘감자튀김’이다. 고구마나 배추를 튀긴다면 ‘고구마튀김·배추튀김’이라 할 테지. 당근이나 닭을 튀기면 ‘당근튀김·닭튀김’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튀김닭·튀김감자’나 ‘닭튀김·감자튀김’이 아닌 ‘프라이드 치킨·프라이드 포테이토’를 먹는다. 때로는 ‘치킨·감자튀김’을 먹는다. 한 손으로는 ‘감자튀김’을 먹는데, 다른 손으로는 ‘치킨’을 먹으면 어쩐지 아리송하지 않을까? 이 손으로도 저 손으로도 ‘튀김’을 먹어야 어울리지 않을까? 튀김닭 (튀기다 + ㅁ + 닭) : 반죽을 입히고 튀겨서 먹는 닭고기. (= 닭튀김. ← 치킨, 프라이드치킨) 22. 씨눈쌀 껍질을 벗긴 ‘벼’는 따로 ‘쌀’이라 한다. 쌀 가운데 속껍질을 안 벗기거나 적게 벗긴 쌀은 누런빛이 감돌아 ‘누런쌀’이요, 속껍질을 말끔히 벗긴 쌀은 ‘흰쌀’이다. 벼·볍씨를 밥으로 지으려고 껍질을 벗기는데, 싹눈이나 씨눈을 고스란히 살릴 만큼 가볍게 벗기니 ‘싹눈쌀’이요, ‘씨눈쌀’이다. 씨눈쌀 (씨눈 + 쌀) : 씨눈을 틔운 누런쌀. 씨눈을 벗기지 않고 겉껍질만 벗긴 쌀. (= 싹눈쌀·싹누런쌀·싹눈누런
[ 배달겨레소리 숲노래 글님 ] 하루 우리말 노래 우리말 새롭게 가꾸기 17. 우쭈쭈 아기라고 모든 곳에서 늘 웃고 반길 수 없다. 아기도 싫어할 만하고 꺼릴 수 있다. 어버이로서 이런 아기를 달래려고 ‘우쭈쭈’ 하면서 높여 준다. 그런데 아기가 아니면서 남보다 높거나 올라야 한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고, 이른바 ‘주례사비평’이나 ‘추대·찬양·칭송·칭찬’만 들으려고까지 한다. ‘우쭐거리’고 싶은 이들은 ‘우쭈쭈’를 받으면서 넋이 나가며 참빛을 잃고 잊는다. 우쭈쭈(우르르 까꿍) : 1. 울거나 골내거나 싫어하거나 지겨워하는 아기를 달래거나 북돋우면서 살살 높이거나 즐겁게 해주면서 내는 소리. 2. 달래거나 북돋우듯 살살 높이거나 즐겁게 해주는 말이나 몸짓. 잘 하지 않았어도 잘 했다고 높이거나 올리거나 값을 좋게 붙이는 말이나 몸짓. (← 과대, 과대평가, 과대포장, 과다, 칭찬, 칭송, 찬미, 찬송, 찬양, 격려, 격려사, 공치사功致辭, 치하致賀, 치사致詞, 극찬, 상찬賞讚, 회유懷柔, 유혹, 유혹, 유인, 유도誘導, 조장助長, 종용, 충동衝動, 선동, 고무鼓舞, 독려, 옹립, 지지支持, 추천推薦, 추대, 노미네이트, 지명指名, 천거, 사주使嗾, 덕담, 축
[ 배달겨레소리 숲노래 글님 ] 하루 우리말 노래 우리말 새롭게 가꾸기 13. 얕바다 바다가 얕으니 ‘얕바다’이다. 바다가 깊으니 ‘깊바다’이다. 멀리 있는 바다이니 ‘먼바다’이고, 뭍은 하나도 안 보이도록 나간 바다이니 ‘난바다’이다. 뭍하고 가까이 있는 바다라면 ‘곁바다’이고, 짜디짠 소금으로 가득한 바다는 ‘소금바다’이다. 얕바다 : 얕은 바다. 뭍하고 가까이 있는 바다. 뭍하고 가까우면서 얕은 바다. (= 얕은바다·곁바다. ← 천해淺海, 연해沿海) 곁바다 : 곁에 있는 바다. 뭍하고 가까운 바다. 뭍하고 가깝기에 물이 얕을 수 있지만, 때로는 뭍하고 가까우면서도 꽤 깊을 수 있다. (= 얕바다·얕은바다. ← 연해沿海, 천해淺海) 14. 팔매금 돌을 던지는 팔짓을 ‘돌팔매’라 한다. ‘팔매’는 첫째, “작은 돌을 멀리 힘껏 던지는 일. 팔을 휘둘러서 멀리 힘껏 던지는 돌.”을 가리킨다. 돌을 던지면 하늘로 올랐다가 땅으로 떨어진다. 둥그스름하게 솟다가 내려가는 길은 물결을 닮는다. 팔매가 흐르는 듯이 금을 그어서 잇는다. 물결이 흐르는 듯이 줄을 쳐서 잇는다. 팔매금 (팔매 + 금) : 팔매를 이루는 금. 흐르거나 바뀌거나 움직이는 결·모습·값·셈을 알
[ 배달겨레소리 숲노래 글님 ] 하루 우리말 노래 우리말 새롭게 가꾸기 9. 힘싸움 힘은 힘으로 막힌다. 힘으로 싸우려 들어서 이기거나 꺾으면, 다른 힘이 몰려들어 눌리거나 지게 마련이다. 그러나 둘레에서는 ‘힘겨룸’에 ‘힘다툼’에 ‘힘싸움’이 판친다. 사랑이 없이 힘으로 밀어붙이려 드니 겨루거나 다투거나 싸운다. 사랑은 모두 아우르고 녹인다. ‘사랑싸움’이라 말하는 사람이 있으나, 틀린 말씨이다. ‘짝싸움·짝꿍싸움’은 있지만, 사랑은 싸움을 녹여내는 길이니 ‘사랑싸움’이란 있을 수 없다. 힘싸움 (힘 + 싸우다 + ㅁ) : 힘을 내세우거나 앞세우거나 보여주면서 싸우거나 어떤 일을 하거나 밀어붙이기. (= 힘다툼. ← 기싸움, 백병전, 실력행사, 무력행사, 파워게임, 패권 경쟁, 경쟁) 10. 퀭하다 퀴퀴할 만큼이라면 가까이하기 어렵도록 고약하게 썩어서 냄새가 난다는 뜻이다. 케케묵다(켸켸묵다)는 그야말로 오래되고 낡아서 이제는 썩어 흙으로 돌아갈 때라는 뜻이다. 흙으로 돌아가면 퀴퀴한 냄새도 케케묵은 빛도 사라지면서 까무잡잡한 숲흙으로 바뀐다. 걱정이 가득하고 잠을 못 이루면 눈밑이 시커멓게 ‘퀭한’ 눈망울이 된다. ‘퀭눈’이다. 퀭하다 : 1. 눈이 쑥…
[ 배달겨레소리 숲노래 글님 ] 숲노래 말넋 고약말 꾸러미 ― 문제아 [국립국어원 낱말책] 문제아(問題兒) : [심리] 지능, 성격, 행동 따위가 보통의 아동과 달리 문제성이 있는 아동. 넓은 뜻으로는 이상아, 특수아, 결함아 등을 뜻하지만 좁은 뜻으로는 주로 행동 문제아를 이른다 ≒ 문제아동 문제어른 : x 문제(問題) : 1. 해답을 요구하는 물음 2.논쟁, 논의, 연구 따위의 대상이 되는 것 3. 해결하기 어렵거나 난처한 대상. 또는 그런 일 4. 귀찮은 일이나 말썽 5. 어떤 사물과 관련되는 일 문제가 있다고 여겨 ‘문제아·문제아동’ 같은 말을 쓰는 어른입니다. 한자말 ‘문제’는 ‘말썽’을 가리켜요. ‘말썽꾼·말썽꾸러기·말썽아이’라고 말하는 셈인데, 둘레를 보면 말썽을 일으키는 어른이 수두룩합니다. 그러나 어른을 보며 ‘말썽어른’이라 말하지는 않아요. 말썽쟁이·말괄량이 개구쟁이·장난꾸러기 “왜 어른한테는 말썽쟁이라 안 해?” 하고 따질 만합니다만, 우리말로는 ‘나이가 많이 든 사람 = 늙은이’요, ‘어른 = 철이 들어 스스로 삶을 짓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가리켜요. 나이가 많기에 어른이 아니라, 철이 들어 어진 사람이 어른입